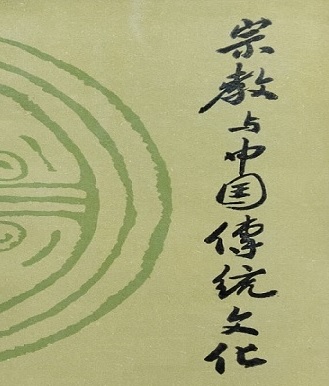에피소드 #1
중국 동북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시에서 남쪽으로 75km 떨어진 방천(防川)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다. 2002년에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었는데, 내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식 명승구로 지정되기 한두 해 전이었던 것 같다. 이후에는 ‘중국-조선-러시아 삼국을 한눈에 볼 수 있다[一眼望三國]’는 선전 문구와 함께 용호각(龍虎閣)을 세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한적한 국경도시였던 훈춘이 이젠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 글에서는 관광지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보았던 특별했던 감흥을 남기고 싶다. 도로는 중국 땅이어서 중국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 양쪽으로 국경 철책선이 쭉 이어져 있었다. 왼쪽은 중러 국경선, 오른쪽은 중조 국경선. 분명 중국 땅인데, 좌우로 양국 땅이 한눈에 들어오던 그 생경함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숲이 우거진 길에 도로를 깔고, 그 좌우에 국경선 철책을 세워 놓은 인간의 위대한 졸렬함으로 만감이 교차했던 듯하다. 투먼[圖們]시 두만강 쪽 다리 위에 그어진 중조 분계선(分界線)을 보았을 때의 감정과는 또 그 결이 달랐다.

에피소드 #2
중국에서 나의 입국을 거부한 지 만 8년이 되었다. 그동안 중국의 주변 나라들에서 중국 땅을 바라볼 기회가 좀 있었다. 그중 K국에서의 일화다. K국에서 중국어를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으슥한 곳에서 중국어로 말했다가는 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란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통해 아스팔트길도 새로 깔아주는 고마운 나라 중국인데, 시장에는 중국 상품들로 가득한데 왜 그럴까? 굳이 내 입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픈 생각은 없다. 영문도 모른 채 8년이 되도록 입국 비자를 계속 거부당하는 처지에 오해를 사고픈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기한 내에 국경을 나가라[限期出境]’고 해서 처분대로 2013년 6월 30일에 북경 공항 통해 출경(出境)했는데 지금까지 입국을 거부한다. 그 이유라도 이 글을 접하는 중국 당국자분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문명공안(文明公安)에 대해 자문을 구하던 연변주공안국 한족(漢族) 공안 대장님께서 답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금년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데, 공산당의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이젠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일을 겪으며 자연스레 ‘국경’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은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단체 활동도 있고, 미래의 초국경 사회를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들도 늘어나건만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는 듯하다. COVID-19 사태로 각국은 국경봉쇄를 방역의 핵심으로 삼기도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멕시코 접경 지역에 높은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을 막고, 코로나 이전이지만 테러범 입국을 거른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였던 캐나다에도 국경 철책선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은 무려 8891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국경선은 피 흘림의 역사’라고도 한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코 중국이다. 육지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만도 총 14개국이다. 동남쪽 베트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외에도 6개국과는 바다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과 함께 요즘도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하는 동중국해(East China Sea)의 일본-센카쿠(Senkaku) 열도[尖閣列島, 釣魚島],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필리핀-스카보로섬(Scarborough Shoal, 黃巖島), 베트남-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 말레이시아-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그리고 황해(Yellow Sea)의 조선과 한국 등 해강(海疆)의 바다 위 다툼은 육강(陸疆)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 타이완 섬 문제까지 연루되면 더 시끄럽다. 단순한 지리와 강역의 문제를 넘어 지정학(地政學)과 변정학(邊政學)의 문제로 비화한다.

위에서 ‘중국의 변강학(邊疆學)’이라고 제목을 내걸었지만, 정작 중국에서 변강(邊疆)이라 할 때는 국경의 개념보다 중앙 혹은 중국(中國)의 안[內]에 대한 밖[外]의 개념으로 쓰인다. 중심부에 대한 변두리 정도라고나 할까. 이 역시 한이즘(Hanism, 漢化)이 낳은 결과라고도 할 것이다. 중국에서 신화열(神話熱)이 불던 시기와 민족학과 변강학이 흥기하던 시기는 묘하게 일치한다. 중국에서 민족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민족의 개념과 다르듯, 변강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개념이란 말보다 의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국식 민족주의는 일반적인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일종의 내셔널 ‘이데올로기’, 즉 이념적 민족이 된 상황이다. 변강학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듯하다. 이런 중국 변강학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원한다면 마다정·리우티[馬大正·劉逖]의 『20世紀的中國邊疆硏究』(1998)와 거자오광[葛兆光]의 『歷史中國的內與外-有關‘中國’與‘周邊’槪念的再澄淸』(2017)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각각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조세현 역, 2004)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김효민 외 3인 역, 2019)으로 번역되어 있다.

앞으로 연재할 방향은 제목으로 삼은 중국식 ‘변강학’의 관점보다는 한국식 ‘국경학’[우리에겐 변강학만큼이나 이런 용어도 생소하겠지만]에 더 가까운 접근이 될 것이다. 연재 순서도 위 표에 열거된 나라들 순서에 맞출 계획이다. 중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세의 국외자가 주변 나라들을 돌며 중국에 접근해 볼까 한다. 중국과 변방의 나라들. 각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면 중국도 그들의 변방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의 중국관’ 정도로 무겁지 않은 변강학 연재가 될 것이다. 이시이 아키라[石井明], 『중국 국경, 격전의 흔적을 걷다』(2014, 이용빈 역 2016)와 이와시타 아키히로[岩下明裕]의 『入門 國境學: 嶺土, 主權, Ideolgy』(2016)도 함께 추천한다.
※ 상단의 [작성자명](click)을 클릭하시면 저자의 다른 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