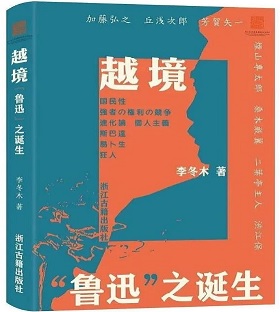황혼(3)
(黃昏, 1932)
선충원(沈從文)
이 시절에 감옥에서 십칠 년을 근무한 간수는 마침 두 다리를 드러내고 사무실 본관 앞 흙탕물 속에서 호미로 진흙을 캐어 고인물을 돌려 빼내고 있었다. 한참 일해도 아무 소득이 없음을 보고 대나무 빗자루를 헤집어 대나무 줄기를 골라 폭우로 물속에 잠긴 해바라기를 지탱하려 하였다. 마당 대부분이 아직 물속에 잠겨 있어도 이 노간수는 봉선화, 맨드라미, 달리아, 닥풀,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십양금화(十樣錦花)를 다른 곳에서 옮겨 와 마당에 둑을 쌓아 뙈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물이 침범하지 못했다. 간수는 이걸 돌보다가 저걸 소홀히 하곤 했다. 그래서 일을 조금 하다가도 이러다간 아무 일도 잘하지 못할 듯 하여 일을 멈추고 본관 처마 밑에 서서 하늘 저녁 구름을 바라보기만 했다. 누런 빛깔에 솜털이 채 벗겨지지 않은 새끼 오리 한 무리가 화초 사이 진흙탕 속에서 즐거이 마음먹은 대로 헤엄을 쳤다. 물속에서 작은 오리발을 내저으며 꽥꽥 소리를 지르고, 하나같이 작은 빨간 주둥이를 물속에 처박고 꽁무니는 작은 사모처럼 꼿꼿이 치켜들었다. 그중 어느 한 마리 새끼 오리가 지렁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물속에서 나오면 나머지 무리들과 서로 다투기 일쑤였다.
노간수는 평생 적어온 가계부를 계산하는데 세목이 잘 들어맞지 않았다. 매달 월급이 십이 촨(串)으로 푼돈이 생기면 빠짐없이 오 년 동안 모았다. 이 돈을 물려받을 양자는 이미 봐뒀고 자신이 입을 수의도 봐뒀고 관도 이미 봐뒀다. 그는 모든 일을 적절히 처리한 후 왜 젊은 시절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더듬었다. 부대 내 방탕한 생활을 생각하니, 자신과 함께 생활한 하얀 얼굴에 눈썹이 긴 여인 몇 명이 떠올라, 기억 한 줄기가 노쇠하고 피폐해진 마음 위로 흘러 지나가며 청춘의 회한이 눈 속에 타올랐다.
밖에서 누군가 “차렷, 쉬어”하고 외치고 말방울 소리가 들리니 부대에서 죄수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이니 다급히 물을 헤치고 나가 무슨 일인지 보았다.
군관이 말에서 내려 가죽 장화를 신고 마당 물속을 당당히 걸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비 서는 보초가 차렷하며 뭐라고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옆으로 보내고 뒤에는 병사 열 명이 따랐다. 간수가 안쪽 문에서 군관과 마주치자 바로 안쪽으로 뛰어들어 간수장에게 보고했다.
간수장은 아편을 옆에 끼고 지내는 인물로 이때 맨발에 홑저고리를 입고 침상 옆에 앉았고 조수는 쪼그리고 바닥에 앉아 요리를 삶으며 오리엔탈의 환상을 그리고 있는데 간수가 창밖에서 외쳤다.
“영감님, 영감님, 부대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 간수장은 부대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신발을 끌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군관은 대청에 우뚝 서서 손가락으로 채찍 끝에 매달린 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병사들은 모두 처마 밑에 서 있었다. 간수장은 길이가 제각각인 열쇠 꾸러미를 방에서 가지고 나왔고 또 죄수들 명부를 들고나와 군관을 보자 경례를 올리며 웃음을 지으며 군관을 모시고 조수에게 어서 빨리 의자를 가지고 나와 차를 따르라 소리 질렀다.
“나으리, 몇 명이나 필요하신가요?”
군관은 아무 말 없이 간수장에게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고 이 간수장은 저녁 빛이 가득한 사무실 대청에서 쪽지를 천천히 받아 읽었다. 읽고 나서 황급히 “그럼요, 그럼요”하며 열쇠 꾸러미를 들고 길을 안내하여 명부를 옆에 끼고 측면 감방으로 걸어갔다. 잠시 뒤 몇 명이 감방 이중문 밖으로 나와 섰다.
노간수는 열쇠 꾸러미를 자물쇠에 밀어 넣어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차례로 열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어둑어둑하여 멀찌감치 반짝이는 눈동자와 흐릿한 윤곽만이 보이고 간수장은 명단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
“자오톈바오(趙天保), 자오톈바오, 양서우위(楊守玉), 양서우위.”
반짝이는 눈동자 두 쌍이 쭈뼛쭈뼛하며 걸어 나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양서우위, 양서우위”라 하며 군말 없이 병사들에게 끌려 나왔다. 간수장은 하나는 왔고 하나가 더 있어 다시 한번 자오 성 가진 사람 이름을 불렀고 간수도 목청껏 같이 불렀지만 한참을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시골 사람 목소리만 들렸다.
“톈바오, 톈바오, 너 부르잖아, 나가봐, 떨 것 없어, 모든 게 다 운명인 게야!”
또 다른 사람이 나지막이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 나가라 권하는 말로 나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원래 붙잡혀 가는 사람은 나가기 무서워 이때 자기가 머무는 짚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습관이 된 것으로 시골 사람들은 대다수 고문을 한번은 받았거나 자백을 무엇인가 했기에 감옥에 갇힌 이유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죽어도 나가려 하지 않아 병사들이 들어가 잡아끌고 나와야 비로소 꺼내올 수 있었다. 이런 일은 감옥에서는 흔하게 보는 일로 군인들과 간수들 모두 익숙해져 있었다. 간수장은 이때 군관을 바라보고 군관이 병사들을 바라보면 몇 사람이 비집고 들어갔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나고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죽기 살기로 기둥을 붙잡고 놓지 않아 여러 명이 들러붙어 제압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어떤 사람이 끌려 나오고 만다. 간수장은 일이 정리된 것을 알고 문을 하나하나 닫아걸고 무거운 자물쇠를 하나하나 달아 걸고 군관과 함께 아무 말 없이 감옥을 떠났다. 대청에 이르러 죄수를 한번 바라보고 해야 할 수속을 마치고 무슨 말인가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향(淸鄕)에 대해 이야기하고 약을 끊는 일을 이야기 하고 군관이 턱짓하면 인마 한 무리가 다시 대열을 갖추어 관청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오려 하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피투성이 얼굴에 눈빛이 사나운 시골 사람에게 노간수는 먼저 다가갔다. “톈바오, 다 괜찮은 거지?” 죄수는 입 언저리가 온통 피투성이로 숨을 헐떡거리며 해가 저물어 벌겋게 물든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지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 행색의 다른 사람이 사실대로 간수에게 고했다.
“나으리,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면 말 좀 전해줘요. 내가 가고 나면 칠장이한테 오백 전 대신 갚아달라고요, 이 돈은 꼭 돌려줘야 해요. ……”
그렇게 대오는 당당히 떠나갔다. 간수장은 간수와 함께 대문을 나서 문밖 벽에 서서 군관이 말에 올라 진흙탕 속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문밖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다린 지 이미 오래로, 어떤 아이들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집에서 못 따라가게 불러, 집에 가도 먹을 저녁밥이 없는 아이들만 남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갔다. 하늘 한켠은 온전히 붉어져 간수장이 하늘을 바라보고 간수도 하늘을 바라봐 모두가 그리도 아름답고 조용하며 엄숙할 수 없었다. 조수 하나가 키 높은 의자 하나를 옮겨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관청 대문 앞에 걸어둔 등불에 두었다. 대문 입구는 온통 진흙탕투성이로 의자가 진흙탕 속에서 기우뚱 흔들려 간수장이 보더니 소리 질렀다.
“조심해! 조심!”
그렇게 조심하라 했건만 곧 의자는 넘어져 사람도 땅에 떨어지고 등불도 땅에 떨어졌다. 기름이 온 땅에 널브러져 그 사람은 기름 속에서 어찌할 바 몰랐다. 간수장은 속으로 군관 기분을 맞추는 게 못마땅하면서도 크게 소리 질렀다.
“내가 조심하라 했지, 부대 화부(火夫)보다도 덤벙대니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놈이군!”
아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 일을 보려고 모두들 모여들었다.
경비병이 아이들을 쫓아 보낸 후 간수장은 자기 방에 삶고 있는 돼지고기에 생각이 미쳐 조수가 이미 절반이나 먹어 치웠을까 봐 겁나 기름으로 흥건한 진흙탕을 조심조심 걸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간수는 진흙탕에 앉아있는 조수를 바라보며 고갯짓을 하니 일어나라며 거기 앉아서 뭐 좋을 게 있냐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 위 빨갛던 곳은 자줏빛으로 변했고 땅 위 구석구석이 흐릿해지는 걸 보니 이제 밤이었다.
1932년 지음
『문예월간』(文藝月刊) 3권 4기 원재(原載)
*沈從文 著, 『沈從文小說選』上,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4, 372-381.
※ 상단의 [작성자명](click)을 클릭하시면 저자의 다른 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